박시하 시인 집에는 베란다를 터서 만든 작고 멋진 작업실이 있다. 그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여운형 선생 묘소를 자신의 정원이라 여기고, 우듬지로 솟는 해와 달을 보며 시를 쓰기 위한 아이디어를 캔다. 요즘 아껴서 읽고 있다는 앨리 스미스의 책, 헤르만 헤세의 장미 빛깔 집 카사로사, 사르트르의 <구토>에 대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시를 읽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고 낙관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시하라고 하고요, 시를 쓴 지는 10년이 좀 넘었어요. 지금까지 시집을 3권 냈고 이곳저곳에서 시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요. 요즘은 주로 집에서
책을 읽거나 개와 산책하고 시도 쓰며 지내고 있어요.
시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30대 중반에 처음으로 시를 써보겠다고 생각했어요.
문학이 아닌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10년 이상 디자이너로 일을 했어요. 결혼 후에도 디자이너로 일하다 육아를 위해 일을 쉬게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뭔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로부터 3년 후에 등단했고요. 등단이란
게 별 의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약 3년 후부터 시도 더 열심히 쓰고 책도 더 많이 읽었으니까요. 제가
국문학과나 문예창작학과를 나오지 않아서 스스로 인문학적 배경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책을 미친 듯이 읽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시인이 되어갔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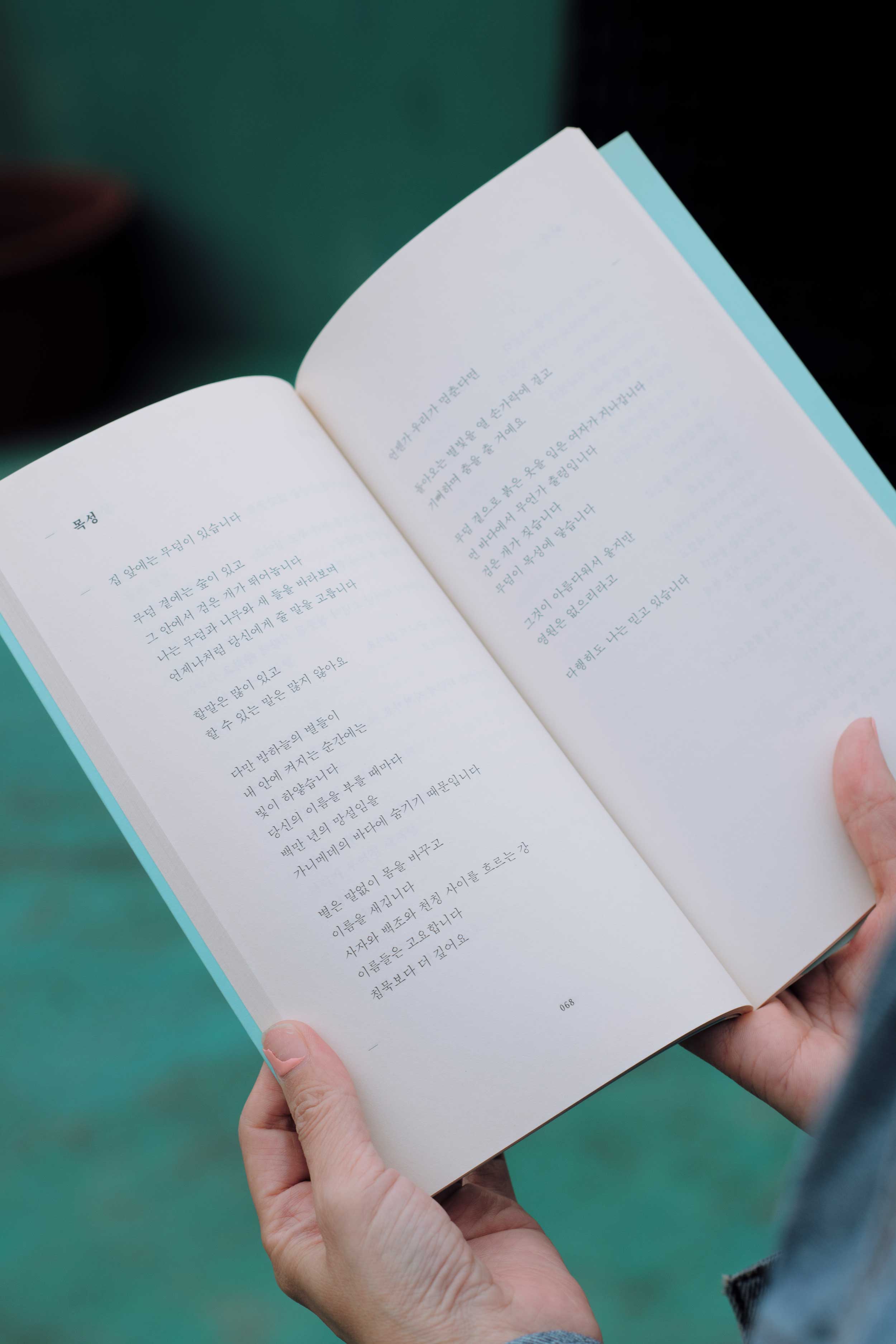
가장 최근에 낸 시집 <무언가 주고받은 느낌입니다>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제가 첫 시집을 냈을 때는 좀 많이 어리숙한 시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에 반해 세 번째인 이번 시집은 제가 쓰고 싶은 걸 눈치 보지 않고 쓴 시를 모은 책이에요. 그중
‘나의 도덕’이라는 시에서
“애초에 삐딱했지”라는 시구를 썼어요. 나이도, 시인으로서의
경력도 꽤 된 후에 느닷없이 ‘나 원래 삐딱했다’고 고백하는
시를 쓴 셈인데 그게 전 재미있어요. 시집 제목은 ‘디어
장 폴 사르트르’라는 제 시 속에서 가져왔어요. 그 시에서
사르트르와 내가 무언가 주고받은 것 같다고 썼거든요.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고 말이죠.
이
집을 봤을 때는 좁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창문을 보고 마음이 달라졌죠. 창문 너머로
탁
트인 풍경이 보여서 정말 좋았어요.
요즘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요?
빼먹지 않고 매일 하는 것은 밤 산책이에요. 제가 밀리라는 이름의 비글을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밀리는 꼭 산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제게는 지옥 훈련 같아요. 힘이
너무 센데, 나가면 무조건 달려야 하거든요. 밀리와의 산책이
하루 중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웃음) 가사 노동을
하는 사이사이에 책도 읽고 시도 쓰고, 그런 일과를 보내고 있어요.
우이동은 어떤
동네이고 이 집에 산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산 집이에요. 물론 대출을 받긴 했지만요. 이 동네에 빌라가 많아요.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아파트도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요. 처음 이 동네에 와서 빌라 몇 군데 둘러보다
이 집을 봤을 때는 좁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창문을 보고 마음이 달라졌죠. 창문 너머로 탁 트인 풍경이 보여서 정말 좋았어요. 옥상에서는 북한산과
인수봉, 도봉산까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주변 경관에
반해 대번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저는 이 집에 살면서 시인이 되었고 몇 권의 시집도 이 집에서 탄생했기에
제가 성장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여기
앞에 여운형 선생님께서 잠들어 계시는데 그분의 기운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집에서
유독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거실 옆의 베란다를 터서 만든 제 작업실요. 여기서 주로 시를 쓰고 책을 읽어요. 베란다였던 곳이라 겨울에는 조금 추워요. 특히 여기서 아침에 창밖을 바라보면 저 언덕 우듬지에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여요. 지는 해와 뜨는 달이 하늘에 함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풍경을 보면 자유로운 기분이 느껴져요. 창밖 풍경이 마치 내 정원 같고, 이 동네 전체가 나의 생활 공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작업실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제 공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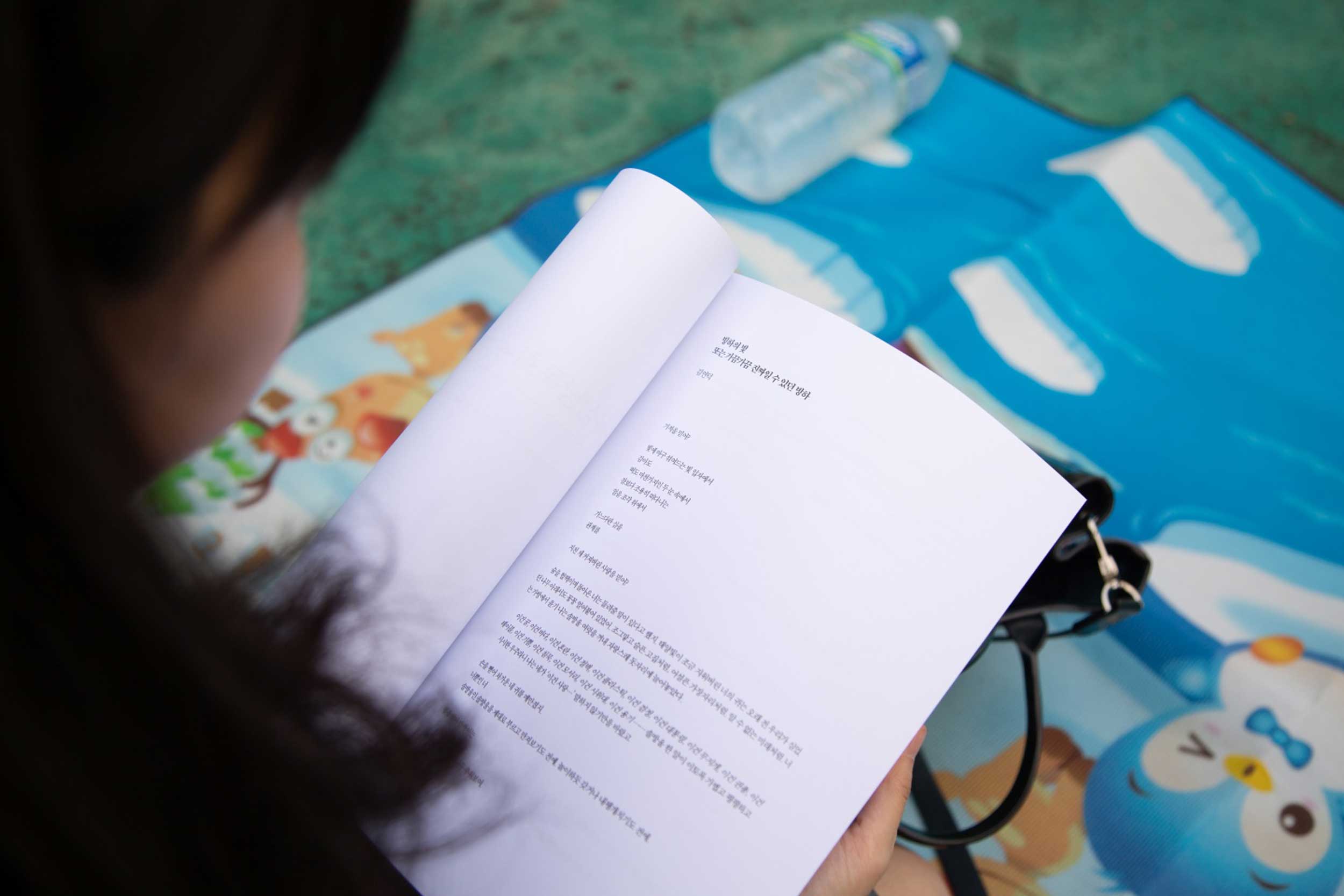
옥상 낭독회를 준비하는 모습 / 박시하 제공

옥상 낭독회 / 박시하 제공
집에서
시 낭독회인 ‘옥상 낭독회’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SNS를 통해 옥상 낭독회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제가 사는
집 옥상에서 너무나 예쁜 장면들이 보이는데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돗자리 깔아놓고 해 지는 것 보면서
같이 시 읽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트윗을 올렸어요.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진짜로 해보자는 반응이 많았어요. 제가 에너지가 많은 편이라 옥상 낭독회를 함께 할 친구들을
포섭해 행동에 옮겼어요. 재작년 5월에 처음 옥상 낭독회를
열었는데 정말 호응이 좋았어요. 시인 섭외는 저희가 따로 했고 관객은 SNS의 DM을 통해 받았어요. 관객
수가 제한되다 보니 신청 열기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옥상 낭독회를 열었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요?
점점 해가 지다가 밤이 되면 캄캄해지는 것이 마치 무대 조명처럼 느껴졌어요. 오신 분들이
모두 행복해하며 떠나는 걸 보고 보람도 느꼈고요. 지금까지 두 번 옥상 낭독회를 열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것은 랜선으로 했어요. 코로나19 탓에 대면으로는 못
했어요. 자기 혼자, 자기만의 옥상에서, 스스로 옥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곳에서, 예를 들면 창가나
언덕 그런 곳이었어요. 실제로 옥상에 모일 때는 어떤 시너지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서 한 시인의 시를 들을 때의 동시성 같은 거요. 반면 랜선
낭독회는 자기만의 개성이 더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참가자는 덴마크 시골집 지붕에서 시를 읽었는데 대체로
바람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체로 멋있었어요. 모든
분의 자기만의 목소리,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읽을 때의 느낌이 새롭게 전해졌죠.


집에
관해 쓴 책, 그림 등 예술 작품 중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읽은 소설이 있어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소녀의 성장 소설 같은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앞으로 먼지 한 톨도 없는
집의 여자가 되지는 말아라”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집을 먼지 한 톨 없이 만들려면 여자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없잖아요. 집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여자가 자유롭게 자기 정신을 계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집에 대한 방향성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것도 어쨌든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환경으로서의 집에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물로 지금의 집이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집은
여자가 자유롭게 자기 정신을 계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미래에 살아보고 싶은 집이 있다면?
아주 오래된 판본의 책 <구토>가 어떤 연유로 흘러들어와서 우리 집에 꽂혀 있었어요. 딱 꺼내 맨 뒷장을 펼쳐보니까 제 중학생 때 글씨체로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헤르만 헤세, 카사로사”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카사로사가 뭔지 기억이 안 나서 검색해봤더니 헤르만 헤세가 한때 살았던 집이더라고요. 장밋빛으로 칠한 집이라는 뜻이래요. 제가 그 제목으로 시를 쓴 것도 있어요.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카사로사처럼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그런 집에 살면서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어요. 서재도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식물을 정말 못 키우는데, 고양이들 때문에 화분이 죽어나가거든요. 나중에 정원이 있다면 나무를 많이 심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어요.